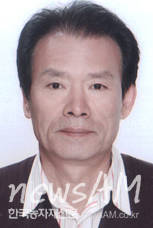 2013년의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작년대비 물량 270만 톤에서 290만 톤으로 20만 톤 증대, 금액은 1,350억 원에서 1,450억 원으로 100억 원이 증액되어 실시된다.
2013년의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작년대비 물량 270만 톤에서 290만 톤으로 20만 톤 증대, 금액은 1,350억 원에서 1,450억 원으로 100억 원이 증액되어 실시된다.
국내 유기질비료 시장규모는 정부지원에 힘입어 2011년 기준 6300억 원(퇴비 4700억원, 유박류 1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내 시장만 본다면 화학비료 시장규모가 71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유기질비료 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룩해왔다.
늘어나는 시장규모와 지원증대에 따라 정부는 불량비료 유통을 막기 위해 해마다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도 새로 개정된 비료관리법을 비롯해 비료 공정규격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내용을 보면 온통 규제강화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퇴비 등급제 실시는 겉에 들어난 그럴듯한 명분 뒤에 공급업체에 대한 끝없는 모순과 갈등 그리도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등급평가 기준이 점수제로 절대평가처럼 보이나 상대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정 비율이상은 절대 1등급을 받을 수 없게 짜여진 상황에서 1등급 분류의 의미는 누굴 위함인지 자꾸 되씹어 보게 한다.
계약금액 인상억제·유통비용 증가 애로
퇴비품질 기준의 절대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퇴비의 품질은 특성상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사용량을 조절하며 시용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비료성분만 유실되어 더 값어치 없는 제품이 되어버리면서 반대로 생산 경비는 올라간다.
그렇다면 숫자상으로만 상위 제품을 설정해 놓고 이를 목표로 업체들만 무한 경쟁을 시킨다면 과연 이는 누구를 위한 경쟁이고 무엇을 목표로 한 제품관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등급제 실시의 당초 목표는 질 좋은 제품에 지원을 더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재 방식처럼 좋은 제품에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함으로 발생되는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제도는 사실 구매자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하고 있다. 좋은 제품을 만든 생산업체는 좋은 제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 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저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박리다매하도록 강요만 받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유기질비료 업계 실태는 업체당 평균 판매액이 6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판매량은 3,000여톤밖에 되지 않는 생계형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퇴비의 생산 공정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규모의 경제가 잘 적용되지 않는 산업이다.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넓은 부지와 많은 저장창고가 필요하고 이렇게 대량생산체제를 갖춘다 하더라도 꼭 경비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소비자의 주문이 늘어난다해도 무한정 제품생산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다음으로 정부지원의 확대로 혜택을 많이 받는 구매자 그룹에는 실수요자인 농업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업인을 대신하여 구매를 담당하는 농협이 있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딜러들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생산업체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그 노력에 댓가는 전혀 보상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품질관리 기준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나 계약금액의 인상은 강력히 억제 당하고 있다. 인건비와 운송비, 자재 대금은 인상되는데 계약금액에는 이러한 가격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날로 심화되는 유통비용의 증가는 생산업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늘어나는 시장규모에 비해 생산업체는 내부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만 있다.
유기질비료는 친환경농업에 필수 자재로서, 계속 확대 지원되는 정책에 걸맞게 공급을 담당하는 업계의 발전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생산시설 규모 증대 및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 토양과 환경에 적절한 품질기준을 확립함은 물론 지원사업 유통체계를 재정립하고 과도하게 발생되는 유통비용을 절감해 양질의 비료가 적정금액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급성장하는 친환경농산물시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