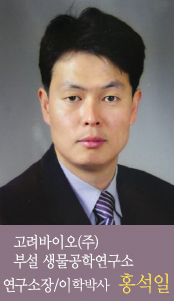그러나 토양 내 질소가 충분할 때에는 뿌리혹박테리아가 발생을 안 한다는 것이다. 기무라씨 이야기로는 작물에 뿌리혹박테리아가 발견될 때는 토양에 질소 성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발생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게 만드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뿌리혹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밀도보다 토양에서 살아갈 조건 토양 속에는 뿌리혹박테리아를 포함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유용한 미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들이 활동 영역을 넓혀 병원성 미생물의 발생도 억제하고 작물에 이로운 물질을 분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양에 발생하는 미생물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병원성 미생물들이 우점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모두가 다 우리가 자초해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토양에 어떠한 미생물이 우점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다. 환경에 의해 그 토양에 우점 되는 미생물의 종류와 밀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토양 내 질소가 모자라면 뿌리혹박테리아가 우점을 하는 것이고, 땅강아지와 같은 곤충류의 죽은 사체들이 많으면 곤충류의 껍데기를 분해할 수 있는 방선균이 우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민들은 현재 내 토양 환경은 어떠한지 고려하지 않은 채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알고 있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토양 속으로 넣어준다. 그렇게 억지로 농민들에 의해 토양 속으로 떠밀려 들어간 미생물들은 아무리 밀도가 높다 할지라도 토양 속에서 살아갈 조건이 안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멸하게 된다. 예전에는 우리 주변에 땅강아지, 쥐며느리, 풍뎅이, 사슴벌레, 하늘소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곤충들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곤충들이 죽을 때는 대부분 토양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생을 마감한 곤충들을 분해하는 것은 방선균으로서 방선균은 곤충의 겉껍데기인 키틴을 분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균이기 때문이다. 유용한 미생물 깨어날 환경 조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토양은 이렇게 방선균이 자연스럽게 우점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었었다. 그러나 화학농약과 비료의 무분별한 살포에 의해 그렇게 많았던 곤충들의 자취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병원성 미생물들만이 우점 할 수 있는 토양 생태계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었다. 요즘 농민들이 방선균은 토양 내 유용한 미생물이라 하여 직접 배양하여 토양 속에 넣어주는데 그렇게 투입된 방선균이 토양 속에서 우점 하여 기대하는 효과가 발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토양 내 원하는 미생물을 넣어주기보다는 원하는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의 토양 속에는 아마도 방선균과 같은 이로운 미생물들이 자라기에는 부적절한 환경가운데에서 아주 적은 밀도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토양에 아무리 방선균을 넣어주어 봐야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토양은 방선균이 살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용한 미생물이니 유익균이니 하는 말들에 현혹되어 특정한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넣어주기 보다는 유용한 미생물들이 깨어 일어나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