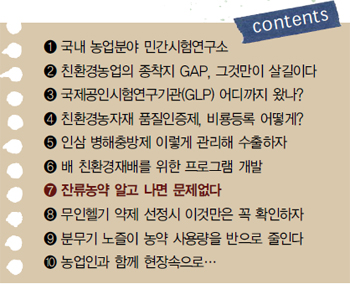한 가지 농약을 연용처리하면 처리한 농약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활성이 증가해 농약의 분해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양의 특성에 따른 농약의 잔류는 토양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유기물 함량이 높으면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해 농약의 분해가 빠른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흡착성이 강한 농약은 토양에 강하게 흡착돼 오히려 분해가 늦어지기도 한다. 토양의 pH도 농약의 분해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알카리성 토양에서 농약 분해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농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 농약은 안정성이 중요한데 농약 고유의 성질에 따라 쉽게 분해되지 않는 성질이 있는 종류도 있다. 또 농약의 제형 및 살포방법, 살포기의 분무압력 등에 따라 농약의 작물체 부착량이 달라진다. 또한, 작물체 표면의 굴곡, 털, 왁스피복 등에 따라 부착량 및 잔류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
농약은 다소간의 휘발성을 가지므로 휘발에 의해 대기 중으로 날아가 잔류농약이 감소한다. 이와 함께 빗물에 의해 씻겨 제거되고 가수분해돼 소실되며 각종 미생물(세균, 방선균 등)이 농약분해에 관여한다. 게다가 온도가 높으면 각종 분해 작용과 휘발이 촉진돼 잔류농약의 감소가 빨라진다. 조직내에 침투한 잔류농약은 식물체내의 대사작용 및 가수분해 된다. 시설재배보다 노지재배에서, 겨울재배보다 여름재배에서 농약잔류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사용기준의 내용은 적용대상농작물, 적용대상병해충, 사용시기(수확 전 최종살포일) 및 사용가능횟수 등 4개 항목을 설정, 농약의 사용자는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농약관리법 제35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사용시기 및 살포 횟수 농산물 중 농약잔류량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특히 사용시기(수확전 최종살포일)는 잔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수확물 중 농약의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농약의 사용방법을 정한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병해충의 방제에 사용하는 농약의 사용가능횟수는 많고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병해충의 방제에 사용하는 농약의 사용시기는 수확기에 근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다. 잔류의 문제가 없거나 독성의 문제가 없는 농약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는 국제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농산물 수출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농약등록상황과 잔류허용기준, 규제내용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설정된 지침은 8개국 23작물 845 병해충 7943품목이다. 또한 국내 등록농약의 일본 잔류기준 설정을 위해 총 12작물 43농약에 대한 의견안을 일본정부에 제출해 현재 8작물 22농약의 기준을 반영시켰으며 10농약은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대만 잔류기준 설정을 위한 사과, 배 등 3작물 19농약에 대해 대만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
GLP 제도 도입 이전의 미국과 유럽에서도 국가와 실험연구소마다 실험방법과 기준이 달라서 서로 데이터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지만, GLP를 도입함으로써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성 시험성적의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상호자료를 인정할 수 있어, 농산물 생산에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
|